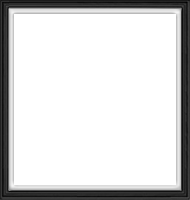| 본문 |
1883년 3월 3일 경상북도 영덕군(盈德郡) 창수면(蒼水面) 갈천(葛川里)에서 태어났다. 1919년 당시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영덕군 창수면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영덕군 만세운동은 평양신학교로 유학 가던 중 서울에서 만세시위를 접하고 돌아온 북장로교 교회 조사(助事) 김세영(金世榮)이 평소 친분이 있던 구세군 참위 권태원(權泰源), 병곡면(柄谷面) 송천동(松川洞) 북장로교 교회 조사(助事) 정규하(丁奎河) 등과 상호 연락을 하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역 양반세력의 협력을 얻어 시위를 이끌어냈다. 시위는 경찰관주재소·면사무소·공립보통학교·공립심상소학교·우편소 등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격렬한 양상으로도 전개되었다.창수면 만세운동은 영해면(寧海面)에서 전날 시작된 운동에 합류하기로 한 시위대에 의하여 촉발되었다. 영해에서는 3월 18일에 장날을 이용하여 성내장터에서 오후 1시경부터 만세시위가 일어났으며 2,000여 명의 대규모의 군중이 운집하였다. 영해의 시위는 3월 19일까지 이어졌다.창수면에서는 오촌동(梧村洞)·삼계동(三溪洞)에서 십 여 명의 시위대를 조직하여 영해로 향하였다. 영해로 가던 중 이들은 합류하기에 시간이 늦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창수경찰관주재소에서 시위를 여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이들은 창수주재소로 향하면서 주변 마을로 들어가 시위의 취지를 설명하고 “한국 독립을 하는데 동참하지 않겠는가”, “창수로 가서 만세를 부르자”고 하면서 동참할 것을 권유하였다. 신기동에 이르러서는 구장 이현설(李鉉卨)과 협의하여 일본에 토지를 빼앗긴 주민들에 시위에 참여를 선전하였다. 신기동을 거치면서 시위대는 150명으로 늘어났고 오후 4시에 창수주재소 부근에 이르러서는 2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이 과정에서 밭에서 일을 하던 중 시위 소식을 들었다. 박재복(朴載馥)과 울진군(蔚珍郡) 출신 배의직이 찾아 와서 “자네는 어째서 일을 하고 있는가, 창주주재소로 가서 만세를 부르는데 동행하자”는 권유를 듣고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시위대는 이수각(李壽珏) 등이 발의한 한국 독립에 대한 취지에 동의하여 창수경찰관주재소 부근에 모여 약 200명의 군중과 함께 한국독립만세를 연창하였다. 그리고 기세를 몰아 이수각의 지휘에 따라 주재소에 들어갔다. 주재소는 사무실 1동, 객사 및 숙사(宿舍) 1동으로 이루어졌는데, 시위대는 숙사의 벽, 천장 등을 파괴하였다. 또한 건물 내에 있던 공문서를 파기하고 탁자와 잡품 등에 손상을 입혔다. 이어서 마을에 순사들이 숨겨 놓았던 물품을 찾아서 파괴하였다. 이때 만세를 부르며 다른 군중보다 앞서 주재소로 가 숙사와 목욕장을 파괴하였고, 숙사에 있는 의류도 파손하였다. 주재소에서 나와 창수교까지 철수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의류와 책이 많이 남았으니 파괴하자”는 말을 하였으며, 이 말을 듣고 주재소 앞 도로까지 되돌아갔다.이 일로 붙잡혀 재판에 회부되었다. 1919년 7월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소요죄, 공무집행방해죄, 건조물손괴죄, 기물손괴죄, 공문서훼기죄, 상해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겪었다.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