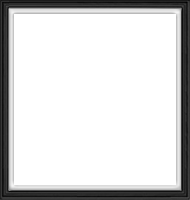| 본문 |
1901년 9월 12일 경기도 시흥군(始興郡) 신북면(新北面) 흑석리(黑石里)(현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서 아버지 상정(相珽)과 어머니 해평 윤씨(海平) (尹氏) 사이에 3남 1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필명 심훈(沈熏)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본관은 청송(靑松)이고, 아명(兒名)은 삼준 또는 삼보, 호는 해풍(海風)·금강생(金剛生)·백랑(白浪)을 사용하였다.1915년 서울 교동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동기생들로 동요 ‘반달’을 작곡한 윤극영(尹克榮), 아나키스트로 유명한 박열(朴烈), 공산주의 운동가 박헌영(朴憲永) 등이 있다. 1917년 왕족인 이해영(李海暎)과 혼인하였다.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거행된 독립선언 민중대회에 참여하였고, 이어 서울 각지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에도 함께하였다. 3월 5일 학생 대표였던 보성법률상업전문학교 강기덕(康基德)과 연희전문학교 김원벽(金元璧) 등이 주도하여 서울의 각급 학생들이 중심이 된 남대문역(서울역) 만세시위에도 참여하였다. 이 만세운동은 서울에서 전개된 최대 규모의 만세시위로 서울 지역의 학생 대부분과 광무황제의 인산을 마치고 귀향하던 지방 유생들도 대거 함께하였다. 이날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일제 경찰에게 붙잡혔다. 1919년 8월 30일 경성지방법원의 예심을 받고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이른바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났다. 그사이 미결기간까지 포함하여 약 8개월간 옥고를 겪었다.풀려난 후 1920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베이징(北京)에서 이회영(李會榮)과 신채호(申采浩) 등을 만났다. 당시 이회영과 신채호는 일제와 어떠한 타협을 거부하는 등 절대독립론에 입각한 무장투쟁론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921년 항저우(杭州) 치장대학(之江大學)에 입학한 후 연극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1923년 졸업과 동시에 귀국하여 최승일(崔承一)·나경손(羅慶孫)(필명 나도향(羅稻香) 또는 나빈(羅彬))·임득산(林得山)·김영보(金永俌) 등과 신극 연구단체인 극문회(劇文會)를 조직하였다. 연극과 영화, 소설 집필 등에 몰두하는 가운데 특히 영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1924년 동아일보사에 사회부 기자로 입사하였다. 그 해 11월 각 신문사 사회부 기자들과 함께 언론운동단체인 철필구락부(鐵筆俱樂部)를 조직하였다. 1925년 4월 철필구락부는 또 다른 언론운동단체 무명회(無名會)와 공동으로 전조선기자대회를 개최하여 일제의 경계 대상이 되었고, 5월에는 동아일보사·조선일보사·시대일보사 기자들과 함께 임금 인상 투쟁을 전개하여 신문사 경영진과 맞서기도 하였다. 이 시기 사회운동과 함께 개인적으로는 조일제(趙一齊) 번안의 ‘장한몽(長恨夢)’이 영화화될 때, 이수일(李守一) 역으로 출연하기도 하였다.1926년 철필구락부사건으로 동아일보사를 퇴사할 무렵인 4월 26일 순종이 사망하였다. 4월 29일, 국장이 준비되는 동안 돈화문 앞에서 「통곡 속에서」를 지었고, 이를 5월 16일자 『시대일보』에 발표하였다. 그 해 11월부터는 소설 「탈춤」을 『동아일보』에 연재하였는데, 이때부터 심훈이라는 필명을 자주 사용하였다. 1927년 일본으로 건너가 본격적인 영화 수업을 받고 돌아와 그 해 10월 영화 「먼동이 틀 때」를 집필, 각색·감독하여 단성사에서 상영하였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1927년 11월 22일 ‘조선공산당사건’으로 체포되었던 경성고보 동창생 박헌영이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때 박헌영을 만나 일제의 고문과 병으로 형편없이 변해버린 몰골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고, 일제에 대한 분노를 「박군(朴君)의 얼굴」이라는 시에 담았다. 1928년 조선일보사에 입사하여 기자로 활동하면서, 문필 활동을 이어갔다.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원산노동자총파업과 용천소작쟁의 등 거센 항일투쟁이 이어졌다. 이에 1930년 3월 1일, 항일 저항문학의 금자탑 으로 평가받는 「그날이 오면」을 발표하였다.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삼각산三角山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한다면,나는 밤하늘에 날으는 까마귀와 같이종로鐘路의 인경人磬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두개골頭蓋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그날이 와서, 오오 그날이 와서육조六曹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메고는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1930년 10월 21일부터는 『조선일보』에 소설 「동방(東方)의 애인」을 연재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게재 정지 처분으로 중단되었고, 이어 연재한 「불사조(不死鳥)」도 게재 정지를 받았다. 두 소설은 중국 망명과 유학 당시의 생활을 소재로 한 것이었는데, 특히 「불사조」는 일제에 대한 옥중투쟁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마음의 낙인(烙印)」, 「필경(筆耕)」 등 항일 문학작품을 다수 투고하였다. 다음 해인 1931년 조선일보사를 사직하고 경성방송국 문예담당으로 입사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두었다.1932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부모님이 계신 충남 당진군(唐津郡) 송악면(松嶽面) 부곡리(富谷里)로 낙향하였다. 창작 생활에 정진하고자 그동안 발표한 시들을 묶어 시집 발간을 추진하였는데, 일제의 검열로 인해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그해 5월 「토막생각」을 투고하는 등 작가로서의 활동을 지속하였다. 1933년 당진에서 장편소설 「영원(永遠)의 미소(微笑)」를 집필하여 7월 10일부터 『조선중앙일보』에 연재하였다. 같은 해 8월 조선중앙일보사 학예부장으로 취직하여 상경하였으나, 곧 그만두고 다시 당진으로 돌아갔다. 1934년 장편소설 「직녀성(織女星)」 집필을 시작하여 3월 24일부터 『조선중앙일보』에 연재하였다. 이즈음 당진에 필경사(筆耕舍)라는 자택을 설계하여 지었고, 여기서 농촌계몽 소설 『상록수(常綠樹)』를 집필하였다.『상록수』는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에서 전개되고 있던 야학운동과 공동경작회 활동을 소재로 1935년 1월 경기도 반월면 샘골에서 농촌계몽운동을 펴다 요절한 최용신(崔容信)의 이야기를 연결하여 완성한 것이다. 『상록수』는 9월 10일부터 이듬해 2월 15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1936년 6~7월에는 장편소설 「대지」를 『사해공론』에 투고하는 등 적극적인 창작 활동을 벌이다가 장티푸스에 걸려 1936년 9월 16일 오전 8시 경성제국대학 부속병원에서 36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1949년 유고집으로 『그날이 오면』이 간행되었다.대한민국 정부는 200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