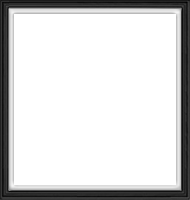2. 1919년 만세사건당시 48인중의 1인으로 동년 6월 상순
3. 1919년 2월 20일
4. 1919년 2월초
5.
- 피포(被捕) : 남에게 붙잡힘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3·1운동 당시 중앙지도체 인사 중의 한 사람으로 평안남도 평원(平原) 출신이다.
1911년 1월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윤치호(尹致昊)·이승훈(李昇薰) 등과 함께 옥고를 치렀다.
조국광복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던 1919년 2월 20일 밤 당시 평양기독서원(平壤基督書院) 총무로 재직하던 그는, 이갑성(李甲成)·오상근(吳尙根)·현 순(玄楯)·함태영(咸台永) 등과 서울 남대문로 5가의 함태영 집에서 만나 독립운동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이튿날에는 다시 세브란스 병원내의 이갑성 방에서 이승훈(李昇薰)·박희도(朴熙道)·오기선(吳基善)·오화영(吳華英)·신홍식(申洪植)·김세환(金世煥)·함태영 등 기독교측 대표들과 만나 거족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천도교측과의 연합문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22일에는 다시 기독교측 대표들과 만나 무조건 천도교측과 연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자신은 임 규(林圭)와 함께 일본 정부에 한국의 독립을 통보하고, 일본 귀족원(貴族院)과 중의원(衆議院)에 독립청원서와 이유서를 전달할 책임을 맡았다.
이에 그는 박희도로부터 여비 500원을 받아 27일 남대문역을 출발하여 3월 1일 동경역에 도착, 우선 신전구(神田區) 준하대(駿河臺)의 용명관(龍名館)에 투숙하였다.
3월 4일에는 경시청에 가서 경시총감(警視總監)을 만나 여러 차례 조선독립의 당위성을 설명하다가 3월 5일에 체포되었다.
이후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긴 옥고를 치르다가 이듬해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받고 석방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194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2권 38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760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74·96·97·147·148·469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2권 6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72·91·122·356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22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2·15·29·40·41·5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135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84면
- 민족독립투쟁사사료(해외편) 18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819·854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11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8권 563·566·56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0권 67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