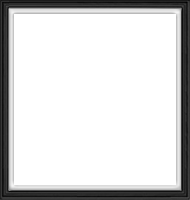2. 1919년 3. 1운동시에는 48인의 1인으로 배후활약을 하여
3.
4.
5. 1929년
6. 1945년 후
(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전라남도 담양(潭陽) 사람이다.
1906년 창평(昌平)의 영학숙(英學塾)에서 김성수(金性洙)와 함께 수학하고, 1908년 김성수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1915년에 명치(明治)대학 법과를 졸업하였다.
유학기간중에 유학생친목회(留學生親睦會)를 조직하고 총무로 활동했으며 「학지광(學之光)」을 편집하였다.
1915년에 김성수를 도와 당시 경영난에 빠져 있던 중앙학교(中央학교)를 인수하여 학감(學監)이 되었다가 김성수의 뒤를 이어 1918년 3월에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송진우의 관리 아래 중앙학교의 교육은 민족교육을 관철했으며 수많은 애국적 청소년들을 배출하였다.
1919년 1월 동경 유학생 송계백(宋繼白)이 2·8독립선언 준비차 귀국하여 송진우를 만난 것을 계기로 하여 송진우·현상윤(玄相允)·최린(崔麟)·최남선(崔南善) 등이 빈번히 회합을 열고 초기의 3·1운동을 기획하기 시작했으며 송진우는 천도교측과 기독교측의 연합을 주선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3·1운동이 일어난 후 이 운동을 초기에 기획한 48인의 하나로 지목되어 일제 경찰에 붙잡혀 서대문감옥에 구금되었다. 1920년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1년 6개월간의 옥고를 겪었다.
1921년 9월 14일 동아일보(東亞日報)가 「주식회사 동아일보」로 개편되자 제3대 사장에 취임하였다.
1922년 11월 이상재(李相在)를 대표로 하고 지도급 인사 47명이 조선민립대학 기성회(朝鮮民立大學期成會)를 발기할 때 발기인으로 참가하여 이 사업을 적극 추진했으며, 동아일보를 통하여 민립대학설립 운동을 적극적으로 선전하였다.
1923년 3월 29일 각계 대표 400명이 서울 종로 중앙청년회관에 모여 조선민립대학기성회 발기총회를 개최하여 전국적으로 1천만원의 기금을 모집하여 재단을 구성하고 민립종합대학을 설립하기로 결의한 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1924년 4월 친일파 박춘금(朴春琴)의 권총협박사건으로 동아일보 사장을 사임하고, 1924년 동아일보사 고문, 1925년에는 동아일보 주필(主筆)로 취임하여 언론활동을 하였다.
1925년 7월 미국 하와이에서 태평양연안 기독교청년회 주최로 범태평양회의(汎太平洋會議)가 개최되자 미국으로부터 참석한 서재필(徐載弼)과 함께 국내대표로 암석하여 활동하였다.
1925년 9월 일제 총독부가 「개벽(開闢)」잡지를 발행정지 시키자 한기악(韓基岳)·민태원(閔泰瑗) 등과 함께 일제의 언론탄압을 비판하고 교섭하여 발행정지의 해제를 얻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신천지(新天地)」와 「신생활(新生活)」의 필화사건이 일어나자 박승빈(朴勝彬) 등과 함께 언론자유의 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1925년 11월에 함경남도 함흥경찰서가 시대일보(時代日報) 지방부장 홍남표를 불법 체포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안재홍(安在鴻)·이종린(李鍾麟) 등과 함께 무명회(無名會)의 교섭위원으로서 그의 석방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1926년 3월에 국제농민회 본부로부터 조선농민에게 전하는 글을 동아일보 3월 5일자에 게재했다가 동아일보가 제2차 무기정간을 당함과 동시에 동아일보 주필 겸 편집국장이던 그와 편집 겸 발행인 김철중(金鐵中)이 일제 검찰에 구속 기소되어 1926년 3월 24일 경성지방법원에서 그는 징역 6월형, 김철중은 징역 4월형의 선고를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7년 10월 제6대 동아일보사장에 취임했으나, 1936년 8월 베를린 올림픽대회의 마라톤에서 손기정(孫基禎) 선수가 우승하자 동아일보가 손기정선수의 우승사진을 게재하면서 손선수의 앞가슴에 붙인 일장기(日章旗)를 지우고 실은 「일장기 말소사건」이 문제가 되자 동아일보는 제4차 무기정간을 당하고 그도 사장을 사임하였다.
1945년 8·15광복 후에는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을 조직하여 수석총무로서 활동하다가 한현우(韓賢宇)에게 암살당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고등경찰요사 45·46·47면
- 박은식전서 상권 514면
- 기려수필 235·413면
- 벽옹김창숙일대기 165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95·96·147·148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820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2권 13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3권 559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335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8권 82·107·250·296·299·399·854·865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69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7·91·35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492·509·648·657·85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8권 146·378·405·565·566·567·568·659·660·86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115·117·120·131·464·791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0권 712·751·768·995·99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2, 15, 29, 40, 41, 6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2권 42, 68, 109, 209, 249, 273, 291, 384, 1055, 128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24, 25, 35, 97, 123, 131, 254, 1443, 171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118, 840, 84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3권 34, 6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