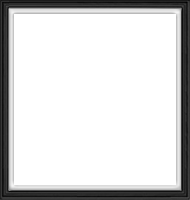| 본문 |
1880년 11월 13일 일본 미야기현(宮城縣) 이시노마키(石卷)의 중농 가정에서 아버지 후세 에이지로(布施榮治郞)와 어머니 기에(きえ) 사이에 2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10세에 고향에서 심상(尋常)소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마을의 한문학 학원에서 한문을 수학하였다. 자유민권운동의 지지자였던 부친의 영향을 받아 부친이 소장하고 있던 동서양 철학서 등을 탐독하고, 강습회 등에서 기독교 사상을 공부하였다.
1899년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 도쿄(東京)로 가서 스루가다이(駿河台)의 니콜라이 신학교와 메이지법률학교(明治法律學校, 현 메이지대학)에 입학하였다. 법률학교 재학 중 한국인과 중국인 등 아시아 유학생들과 교류하였다. 그리고 기독교 사상과 운동에 관여하면서 기노시타 나오에(木下尙江)‧가타야마 센(片山潛)‧고토쿠 슈스이(幸德秋水)‧아베 이소오(阿部磯雄) 등 기독교적 성격이 농후한 사회주의 사상과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1902년 메이지법률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일본 판검사등용시험에 합격하였다. 1903년 4월에 사법관시보로 임명되어 우츠노미야(宇都宮)지방재판소에 부임하였다. 같은 해 8월 「사직의 이유」를 발표하고, 검사라는 직책이 탐욕스럽고 잔인한 직업이기 때문에 검사대리 겸 사법관시보를 사직하였다. 도쿄변호사명부에 등록하고 1905년 요츠야(四ツ谷)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이 무렵부터 러시아의 톨스토이 문학론에 심취하여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사회 문제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나타내었다.
1906년 도쿄 시영(市營)전차 요금인상반대 시민대회사건으로 체포된 사회주의자 야마구치 요시조(山口義三)를 변호하였다. 이후 노동문제, 보통선거운동, 사회주의 등 당시 일본 내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한 시민운동과 함께 각종 시국 사건 및 노동쟁의 사건에 대한 변론활동을 전개하였다. 1910년 메이지 국왕의 암살을 계획한 고토쿠 슈스이 등의 대역사건에 개인 자격으로 공판을 방청, 고토쿠 슈스이의 법정 태도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1911년 메이지법률학교 재학 중 조선인 유학생들과 교류하며 조선 독립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이 무렵에 「조선의 독립운동에 경의를 표한다」라는 글을 발표하여 일본 검사국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선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나타낸 것은 3‧1운동 전후한 시기이다. 1919년 2‧8독립선언 관련자로 도쿄에서 체포된 조선인 유학생의 제2심 변호, 가마이시(釜石) 광산 파업 사건 변호, 야하타(八幡)제철소 파업사건 변호, 오오스기 사카에(大杉榮) 등의 아나키스트 변호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고, 일본의 쌀소동 사건 변호를 정리한 『살기 위해서』를 출간하였다. 이후 일제에게 수감된 최팔용(崔八鏞)·백관수(白寬洙) 등 9명에 대한 이른바 출판법 위반 사건의 제2심 변호를 맡았다.
1920년 개인잡지 『법정에서 사회로』를 창간하고, 창간호에 ‘사회운동에 헌신하는 변호사로 살아가겠다’는 취지의 「자기혁명의 고백」을 발표하였다. 1921년 고베(神戶), 가와사키(川崎) 조선소 노동쟁의를 계기로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자유법조단(自由法曹團)을 결성하였다. 1922년 도쿄에서 세입자동맹을 창립하고, 기관지 『생활운동』을 발행하였다. 1923년 4월 잡지 『아카하타(赤旗)』 창간호에 ‘무산계급으로부터 본 조선해방문제’라는 글을 게재하고, 일제의 억압을 받는 조선민중을 해방시키는 노력을 하자고 역설하였다. 같은 해 7월 말경에 처음으로 조선을 방문하였다. 조선인 유학생의 사상단체인 북성회(北星會)가 주최하고 동아일보사가 후원하였던 하기(夏期) 순회강연회에 강사로 참가하였다. 북성회 회원 김종범(金鍾範) 등과 함께 서울에 도착한 후 첫 담화에서 조선총독부의 개발 정책은 조선인의 행복과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총독부를 비판하였다. 강연단은 같은 해 8월 1일 서울에서의 강연을 시작으로 12일까지 남부 각지에서 10여 회에 걸쳐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조선 체류기간 중 경성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던 의열단원 김시현(金始顯)의 재판을 변호하였다. 다만 경남 진해(鎭海)에서 개최된 조선형평사(朝鮮衡平社) 창립기념행사에 참가하여 직접 변론할 수 없게 되자, 담당 변호사 이인(李仁)에게는 변론 요지가 담긴 전보를 보내고 김시현에게는 위문 전보를 보냈다.
일본으로 귀국한 후 1923년 9월 관동대지진이 일어났다. 이때 수많은 조선인이 학살되자, 조선인을 자신의 집에 보호하는 한편 조선인 학살 사건을 조사, 고발하기 위해 자유법조단과 함께 앞장섰다. 같은 해 10월 도쿄의 조선인 유학생이 결성한 ‘도쿄 지방 이재(罹災) 조선인 후원회’에 고문으로 참가하고, 12월에 개최된 ‘피살 동포 추도회’에서 추도 강연을 통해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 후 관동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에 대한 사죄문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신문사에 보내었다.
1924년 도쿄의 일왕에 사는 왕궁 니주바시(二重橋)에 폭탄을 던진 의열단원 김지섭(金祉燮)의 변호를 담당하였다. 1926년 2월과 3월 일본 대심원 특별법정에서 일왕 암살 미수 혐의로 체포된 박열(朴烈)·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를 변호하였다. 가네코 후미코가 옥중에서 의문사를 하자 그녀의 유골을 인수하여 박열의 고향인 경북 문경에 안장할 수 있도록 힘썼다. 이 해에 미에현(三重縣) 기노모토(木之本) 마을의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쳤다.
1926년 3월 조선 농민의 간절한 요청을 받아들여 전라남도 나주군(羅州郡) 궁삼면(宮三面)의 토지 분쟁에 대한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두 번째로 조선을 방문하였다. 이른바 ‘궁삼면의 토지회수운동’은 조선후기부터 식민지 시대에 걸쳐 봉건 지배층과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상대로 전개된 조선농민들의 토지탈환 투쟁이다. 3월 2일부터 11일경까지 조선에 체류하는 동안 일본 경찰의 방해와 탄압 속에서 농민에 대한 개별 조사와 현장 답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건 관련자의 석방을 위해 전남도청과 광주지방법원을 방문하였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전주·광주 등지에서 조선인이 주최한 시국강연회에 참여하고, 지역의 청년단체와 농민단체 등을 직접 방문 조사하였다. 1926년 4월 귀국한 후 도쿄의 우에노(上野) 공원에서 ‘조선문제 강연회’를 통해 토지문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여기서 산미증식계획의 본질을 비판하면서 결국 일본의 식민지 농업정책은 일본의 인구문제와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존재하여 대다수의 조선 농민은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음을 폭로하였다.
1927년 3월 타이완(臺灣)의 니링 사탕수수농민조합 소요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타이완에 갔다. 9월 히비야(日比谷) 공원에서 조선총독부 정치비판 연설회를 개최하였고, 10월 조선공산당사건 변호를 위해 세 번째로 조선을 방문하였다. 이 사건의 한국인 변호인단은 김병로(金炳魯)·허헌(許憲)·이인 등을 중심으로 하고, 일본에서는 후루야 사다오(古屋貞雄) 등과 함께 참여하였다. 10월 8일에는 서울에 도착하여 우선 조선공산당사건의 공개공판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어 피고인에 대한 장기구금의 문제점을 통박하고 신속재판을 요구하였다. 10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다른 변호사와 함께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하여 강달영(姜達永)·김약수(金若水)·권오설(權五卨)·박헌영(朴憲永) 등 총 26명을 면회하면서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사건에 대한 증거조사 등을 통해 공판전략수립을 주도하였다. 생명이 위독한 박헌영 등 4명에 대한 보석신청을 하여 결국 백광흠(白光欽)의 보석을 얻어내었다. 10월 15일 저녁 공산당사건의 가족을 위하여 ‘피고가족위안회’를 주최한 후 밤에 도쿄에 긴급한 변호사건의 해결을 위해 서울을 떠났다. 10월 16일 피고인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종로경찰서의 미와 와사부로(三輪和三郞)·김면규(金冕圭) 등 5명의 고문경찰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조선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일본에 돌아와서도 조선공산당사건의 사법권침해와 고문문제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노동농민당 소속 변호사를 파견하여 변론 활동을 하는 데에 일조하였다.
1927년 12월 네 번째 조선을 방문하여 조선공산당 공판의 최종 변론에 참여하였다. 이 해에 개인잡지 『법률전선』 간행을 하였다. 1928년 합법적 좌익단체인 노동농민당에 입당하여 제1회 보통선거에 노동농민당 후보로서 니가타현(新瀉縣)에서 입후보하였으나 낙선하였다. 같은 해 해방운동희생자구원회 결성에 참가하고, 법률부장으로서 1928년 3.15 일본공산당사건, 1929년 4.16 일본공산당의 변호인으로 활동하였다. 1929년 일본의 조선인과 함께 ‘재일조선인노동산업희생자구원회’를 결성하였고, 일본공산당사건의 변호 활동 중 과격한 발언으로 징계재판에 회부되었다. 1930년 이른바 신문지법과 우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1931년 김한경 등의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을 변호하였으며, 1932년 유종환·유여종 형제의 일본 사복형사 살해사건을 변호하였다. 그해 11월 징계재판에서 제명이 결정되어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었고, 1933년 이른바 신문지법과 우편법 위반 사건의 상고가 기각되어 금고 3월의 실형이 확정되었다. 도쿄의 토요다마(豊多摩)형무소에서 수감되어 옥고를 겪었다. 이후 일본 ‘황태자 탄생 기념’ 특사로 변호사 자격이 부활되었다. 1935년 공동으로 이용하는 산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이와테현(岩手縣) 야마무라(山村)에 가서 공동주택 건설 등에 대해 상담하였다.
1939년 9월 ‘일본노농변호사단 치안유지법 사건’으로 체포·기소되어 징역 2년을 받고 변호사 자격을 잃었다. 1939년 6월 치바(千葉)형무소에 수감되었고, 1940년 7월 이른바 ‘기원 2600년 기념’ 특사로 석방되었다. 1944년 2월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수감되었던 셋째 아들 모리오(杜生)가 교토(京都)의 야마시나(山科)형무소에서 옥사하였다. 이후 당시 요코스카시(橫須賀市)의 어촌 고츠보에서 칩거하던 중 패전을 맞이하였다.
1948년 재일한국인들이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막걸리를 밀주하여 시장에 내다 판 ‘탁주밀조사건’, 오오사카(大阪)와 고베(神戶)에서의 한국인학교철폐에 반대하는 이른바 ‘한신(阪神) 민족교육 투쟁’, 조선국기게양사건 등 해방 이후 재일한국인이 관련된 거의 모든 사건의 변호를 담당하였다. 또한 재일한국인단체인 재일조선연맹과 협력하여 재일한국인의 선거권 부여요구운동 등을 통하여 한일연대 공동투쟁을 전개하였다. 1953년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의 3.1운동 기념대회에서의 연설을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쳤다.
대표적인 저술은 『조선여행기』, 『조선의 산업과 농민운동』, 『조선건국헌법초안사고』, 『운명의 승리자 박열』 등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4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