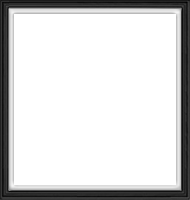| 본문 |
1882년 3월 3일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함안(咸安)이고, 호는 구심(求心)이다. 본적은 경기도 연천군(漣川郡) 남면(南面) 황방리(篁芳里)이다. 아버지 정규(禎奎)와 어머니 박필양(朴必陽) 사이에서 6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함안 조씨 시조는 고려 창건 당시 개국공신 조정(趙鼎)이다. 조정의 10세손 조열(趙悅)은 고려 멸망 후 함안에 은거하며 절의를 지켰고, 12세손 조려(趙旅)는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대하며 은거한 생육신 중 한 사람이다. 조려의 8세손 조봉원(趙逢源)은 김상헌의 문인이자 김창집의 스승이었고, 셋째 아들 조송(趙松)은 송시열의 제자로 김창집 형제와 친분을 맺었다가 이른바 노론4대신 등이 처형당하는 신임사화(辛壬士禍)에 연루되어 사망하였다. 할아버지는 황파(篁坡) 조성룡(趙性龍)으로 통정대부를 지냈고, 아버지 이화재(理化齋) 정규는 1937년경 중국으로 건너가 조소앙(趙素昻)과 함께 생활하다가 1939년 10월 12일(음력 8월 30일) 부인 박필양을 먼저 여읜 뒤 20일 뒤인 11월 1일(음력 9월 20일) 중국 쓰촨성(四川省) 치쟝(綦江)에서 사망하였다.
이처럼 조선조 노론 기호학파 가문의 절의파와 생육신의 후손이었다. 그와 그의 동생들의 이름은 중국 역대왕조인 하·은·주 등을 본 따서 지은 것이다. 형제로는 조소앙으로 널리 알려진 큰 동생 조용은(趙鏞殷, 1989·대한민국장)을 비롯하여 조용주(趙鏞周, 1991·애국장), 조용한(趙鏞漢, 1990·애국장), 조용제(趙鏞濟, 장녀, 1990·애족장), 조용진(趙鏞晋), 조용원(趙鏞元, 일명 趙時元, 1963, 독립장)이 있다. 부모를 모시기 위해 고국에 남은 5남 조용진을 제외한 6남매가 모두 중국으로 망명, 독립운동을 하였으며 이들 모두는 독립유공자로 포상되었다.
아내는 김연원(金蓮圓, 1933년 당시 39세)이고 슬하에 아들 조이제(趙利濟)와 딸 조기련(趙琦璉)을 두었다. 처와 자녀들은 1922년경부터 중국 상하이(上海) 영국조계에 거주하였다고 한다. 후일 조이제가 사망하여 양자를 들여 대를 이었다고 한다.
조송의 8대 종통(宗統)을 잇는 종손으로 태어나 8세부터 15세까지 조부로부터 한학을 수학하여 한학에 조예가 깊었다고 한다. 14세에 결혼하였고, 16세인 1897년 봄 한성관립불어학교(漢城官立佛語學校)에 입학하였으며 이어 관립법무학교(官立法務學校) 혹은 법관양성소를 다녔다. 1901년 봄 졸업할 당시 영어·프랑스어·중국어·독일어 등 4개 국어에 능통하였다. 다만 관립법무학교의 실체는 확인되지 않는다. 1901년 3월 14일 독일·오스트리아 주재 한국공사관(駐箚德墺公使館) 서기생(판임관 6등)으로 임명되어 5월 독일로 출발하였다. 독일에 근무하면서 동생 조소앙에게 여러 차례 서신과 책을 보내 동생의 학업과 진로에 대해 조언하기도 하였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으로 인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해외 각지의 한국공사관이 철폐되자 소환되어 귀국하였다.
1906년 2월 독일로부터 귀국 도중 일본 도쿄(東京)에 들려 유학생활을 하던 조소앙과 잠시 만났다. 1907년 7월 24일 경기 죽산(竹山, 현 安城)군수(주임관 4등)로 임명되어 군수로 선정을 베풀어 1908년 1월 “법률에 밝고 외국말도 익숙하여 송사 처리와 외국인 교섭을 모두 합당하게 하여 부임한 지 불구(不久)에 인민이 대단 감복한다”는 평을 받았다. 같은 해 8월에는 죽산군 사립 명신학교(明新學校) 개교식 때 찬성금을 후원하였다. 1909년 5월 5일 이천(利川)군수(주임관 4등)로 임명되었다. 1910년 경술국치 직후인 12월 26일 일제로부터 정8위(正八位)에 서훈된 데 이어 ‘일한병합기념장’을 수여받았다. 그러나 전북 금산군수(錦山郡守) 홍범식(洪範植)의 자결소식을 듣고 1911년 4월 군수를 사직하였다. 이때 중국 베이징(北京) 거주 독일인과 평북 벽동광산(碧潼鑛山)을 공동 경영하기 위해 시찰하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인사국장 구니와케 쇼타로(國分衆太郞)의 추천으로 1912년 11월 마전(麻田, 현 漣川수로 임관되어 1913년 9월 중순까지 근무하였다. 9월 19일 군수 사임 후 다시 중국 베이징의 독일인을 찾아가 금광 경영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독일인이 투자 보류 의사를 밝히자 단념하고 1914년 4월 귀국하였다.
귀국 후 일본 관헌들의 감시가 심해지자, 1916년 10월 부모와 처자식을 고향에 남겨두고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서 전부터 알던 노백린(盧伯麟), 조명구(趙命九) 등을 만났다. 이들과 함께 그해 11월 중순 상하이에서 유학생을 가장하여 무여권 상태로 하와이행 미국기선 차이나호를 타고 12월 5일 하와이에 도착하였다. 호놀룰루 도착 후 이승만(李承晩)이 경영하는 한인여자성경학원(한인기독학원 전신)에서 한국어 교사로 5개월간 근무하였으며, 그후 카우아이섬으로 건너가 한인학교 교사로 6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다시 호놀룰루로 왔다.
1919년 3월 3일 박용만(朴容萬)은 대조선독립단(大朝鮮獨立團) 하와이지부를 조직한 뒤, 같은 달 30일 발기회를 정식 거행하였고, 임원을 선정하였다. 이때 대조선독립단 기관지 『태평양시사(太平洋時事)』 사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가 대조선독립단 설립을 계기로 하와이 독립운동단체가 분열될 것을 염려하여 국민회와 대조선독립단의 합동을 추진하여 7월 18일 두 단체는 통합되었다. 그러나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9월 국민회와 독립단은 다시 갈라섰다. 이에 이종홍(李鍾鴻)·조병요(趙炳堯)·강영효(姜永斅) 등과 함께 독립단 재조직에 착수하는 한편, 12월 독립단 총단장을 맡으며 하와이 전 지역에 26개 지부를 부활시키고 단원 1,000여명을 확보하였다. 또한 단원들로부터 매달 1달러씩 독립운동저축금을 징수하여 독립운동자금으로 활용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 상하이에 있는 동생 조소앙의 독립운동자금과 가족들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1919년 7월 호놀룰루에 위치한 위성턴나병연구소에 2년간 근무하였다.
1920년 1월에는 이승만 계열이 장악하고 있는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에 반대하며 이내수·황사용·방화중·정칠래 등 30여 명과 한인공동회를 조직하고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에 하와이지방총회의 해산을 요구하였다. 이 시기 친동생인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총장 조소앙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며 외교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1921년 5월에는 미국인이 경영하는 프레젠트호텔 야간경비원으로 10년간 근무하였고, 1928년 2월 26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그동안 분립(分立)되었던 하와이대한인교민단과 대조선독립단 인사가 합동하여 대한민족통일회를 조직하기로 의결하고 촉성회 준비회를 구성하자, 준비회 회장으로 선임되어 5월 20일 대한민족통일촉성회를 구성하고 활동하였다. 같은 해 9월 대한민족통일촉성회 주최로 누아누청년체육실에서 국치일을 맞는 식을 거행하자 이에 참석하여 ‘망국의 역사’라는 주제로 연설하였다.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을 계기로 대조선독립단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1930년 1월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당 통일을 목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29인과 함께 취지서를 발표한 뒤 2월 이들과 함께 한인협회(韓人協會)를 창설하고 집행위원장 겸 임시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11명이 한인협회를 탈퇴하여 이승만의 동지회로 가버리자 새로 임원을 선정하고 다시 회장에 선임되어 서기 강영효, 재무 이정두, 그리고 태병선·홍한식·편성원·정원명 등 중립적 인사들로 재편하였으나 끝내 한인협회는 해산되었다.
한인협회 해산 이후 1930년 4월부터 하와이를 떠날 때까지 호놀룰루의 슈메트자동차회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1930년 12월에는 하와이대한인교민단에 입단하였으나 1931년 8월경 탈퇴하였다. 1932년 4월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부장인 조소앙이 상하이 중한동맹회(中韓同盟會) 조직선언서와 입회신청서를 하와이로 부쳐오자, 태병선을 가입시켰으며, 입회금과 인구세 등을 징수하여 당시 상하이에 있던 장남 조이제를 통해 조소앙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던 중, 1932년 9월 29일 미국 기선 프레지던트 후버호를 타고 호놀룰루를 떠나 상하이를 향해 출발하였다. 10월 11일 일본 고베(神戶)항에 후버호가 잠시 기항하자, 12일 일본 고베 수상경찰이 배에 올라 그를 연행한 뒤 행방불명이 되었다. 이에 함께 동행했던 신기준(申基俊)이 이 사실을 후버호 선장 앤더슨에게 말하자, 앤더슨 선장은 기선 본사와 상하이 미국영사관에 전보를 보내 조사를 요구하였다. 또한 국제법상 선객의 국적에 관계없이 선객을 체포할 때에는 반드시 선장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일제 경찰이 동의도 없이 선객을 체포한 것은 불법이라고 항의하였다. 이에 상하이 미국영사는 일본 외무성에 항의하였다.
체포된 뒤 두 달 동안 일본 효고현(兵庫縣)경찰부 특고과(特高課, 특별고등경찰과)에서 취조를 받고 12월 고베(神戶)지방재판소 검사국으로 송치되어 다시 취조를 받았다. 1933년 1월 11일 효고현경찰부 특고(特高, 특별고등경찰) 마츠모토(松本) 경부보와 이케다(池田) 형사에게 호송되어 서울역에 도착한 뒤 경기도 경찰부에 수감되었다. 경기도 경찰부는 도산 안창호(安昌浩)를 취조하였던 미와(三輪) 경부로 하여금 그를 취조하게 하였다. 1월 14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어 사사키(佐佐木) 검사로부터 다시 취조를 받았다. 이때 당시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겪던 안창호도 증인으로 소환되어 신문을 받기도 하였다.
1933년 3월 3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자, 재판 중간 재판장이 ‘공안’을 이유로 일반 방청객을 퇴장시켰다. 이때 무료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 김병로(金炳魯)가 근친자(近親者)에 한해 방청을 허용할 것을 주장하여 동생과 상하이에서 귀국한 자녀 등 가족 4~5명은 방청이 허락되었다. 변론에서 김병로는 무죄를, 변호사 이인(李仁)은 집행유예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자, 그 자리에서 공소(控訴)를 포기하였다. 옥중에서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 “조심스럽게 어진 형 수주(樹州) 변영로에게 올려 부평초 같이 떠돌다가 만난 인연을 감사히 표시해 달라”고 하였다. 출옥 후 옥중생활의 여독(餘毒)으로 고생하다가 1939년 4월 22일 오전 2시 30분경 적십자병원에서 신장염으로 사망하였다.
정부는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