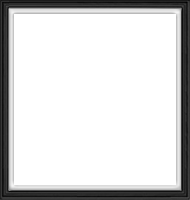| 본문 |
1884년 6월 25일 한성부 종현(鍾峴, 현 서울시 명동)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담양(潭陽)으로 아버지는 전성근(田聖根)이고, 어머니는 이성녀(李姓女)이다. 자는 영선(永善)이고, 호는 죽암(竹嵒)이며, 미국에서는 맥 필즈(Mark Fields)라는 이름을 썼다. 형 전명선(田明善)의 셋째 아들인 영덕(泳德)을 양자로 삼았으나, 1919년 사망하였다. 딸 경숙(慶淑, 영어명 Rosemary)·경영(慶怜, 영어명 Margaret)과 아들 알프레드(Alfred Fields)를 두었다.
12살과 17살 때 어머니와 아버지를 차례로 여의고, 큰형 전명선(田明善) 집에서 가사를 도우며 생활하였다. 의협심이 강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올곧은 성품을 지녀 친구들과 시국을 토론하고 독립협회가 주관한 시국강연회와 토론회에도 참여하였다. 1902년 2년제 관립 한성학교(漢城學校)에 들어가 신교육을 받았고, 동갑인 조순희(趙順姬)와 결혼하였다. 1903년 하와이로 이주하였고, 1916년 아내 조순희를 미국으로 데려왔다.
1903년 9월 21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하였고, 오아후(Oahu)섬 사탕수수 농장에서 1년간 노동하였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1904년 9월 23일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하여, 한인감리교회에 거주하면서 부두와 철로공사 현장에서 일하였고, 방직공장 보일러실 화부(火夫)나 알라스카 어장에서도 노동하였다. 이 무렵 북미 최초 한인들의 결사인 샌프란시스코 한인친목회에 참여하였다. 1906년 12월에는 공립협회(共立協會) 샌프란시스코지방회 응접위원으로 임명되었고, 1907년 9월 28일 ‘식산만 풍부하면 경제가 부족하더라도 재정을 가히 부유하게 한다’는 연설을 하였다. 10월 26일「공립신보 확장할 취지서」에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1908년 2월 한인청년회 초청 토론회에서 ‘모험시대’라는 제목으로 연설하였다.
1907년 이후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본계 이민을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자, 미국 서부지역에서의 일본인 노동자 배척운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본 정부는 대한제국 외교고문인 미국인 스티븐스(Durham White Stevens)의 미국 파견을 결정하였다. 1908년 3월 20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스티븐스는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지배는 한국에게 유익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망언을 쏟아냈다. 3월 21일 신문기자와의 인터뷰 기사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San Francisco Chronicle)』과 『로스앤젤레스 타임즈(Los Angeles Times)』에 보도되었고, 이 기사에 재미 한인들은 분노하였다. 같은 날 북미 한인의 대표 조직인 공립협회와 대동보국회(大同保國會)는 ‘스티븐스 사태’ 해결을 모색하고자 공립관에서 한인공동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공립협회의 최정익(崔正益)·정재관(鄭在寬)과 대동보국회의 문양목(文讓穆)·이학현(李學鉉) 등을 대표로 선출하였다.
3월 22일 오전 네 사람은 스티븐스가 투숙하고 있는 호텔 로비에서 스티븐스를 면담하고, 친일 성명을 취소해 줄 것과 정정 보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리고 스티븐스가 여전히 일제의 시정방침이 한국에 유익하다는 망언을 거듭하자, 분을 참지 못한 정재관이 스티븐스를 주먹으로 내리쳤고 다른 총대들도 의자를 들어 공격하였다. 최정익 등은 공립관으로 돌아와 제2차 한인공동회를 열어 스티븐스를 ‘국적(國賊)’으로 정의하고, 더 이상의 해악을 끼치기 전에 처단할 것을 결의하였다. 전명운도 이 자리에 공립회원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숙소로 돌아와 스티븐스의 사진을 구해 얼굴을 익히고, 다음날 오클랜드 항구에서 워싱턴으로 떠날 예정인 스티븐스의 동선을 점검하며 거사를 준비하였다.
1908년 3월 23일 아침 일찍 권총을 소지하고 오클랜드(Oakland) 도선(渡船)대합소인 페리 빌딩 앞에서 스티븐스를 기다렸다. 9시 10분경 호텔 측이 제공한 자동차로 재미 일본영사관 총영사 고이케 초조(小池張造)와 스티븐스가 내렸다. 9시 30분경 이스트가(East St.) 쪽으로 걸어가는 스티븐스를 향해 권총을 발사하였으나 총알이 발사되지 않자 총자루로 스티븐스의 얼굴 왼쪽을 가격하였다. 스티븐스가 반격을 하려 하자 도망치려 하였다. 이때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장인환(張仁煥)이 권총 3발을 연발로 쏘았다. 첫 총탄이 전명운 어깨에 맞았지만, 나머지 2발은 스티븐스의 가슴과 하복부에 명중하였다. 장인환이 현장에 있던 세관직원 헨리 섹스톤(Henry P. Sexton)에게 손을 맞고 권총을 떨어뜨린 후, 순찰 중이던 오헨스(Edward Owens) 경관에게 붙잡힐 때, 경찰관 맥그란드(James McGrand)에게 붙잡혀 인근의 항만응급병원(Harbor Emergency Hospital)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레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한편 총상을 입은 스티븐스도 고이케 영사에 의해 항만응급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고, 다시 세인트 프란시스 기념병원(Saint Francis Memorial Hospital)에서 탄환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이틀 후인 3월 25일 사망하였다.
공립신보는「의사 전명운씨의 대담」이라는 기사를 실어, 스티븐스 처단의 이유를 “일본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러시아와 전쟁한다고 세계에 공언하더니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아 토지를 늑탈하고 민가를 충화(衝火)하고 부녀를 강간하고 재정을 말리우고 관직을 차지하였으며 헌병 순검이 경향에 가득하여 우리의 생명을 학살하니 한국 내에서는 자유행동을 얻을 수 없다 … 우리 동포의 애국성으로 일본을 반대하는 일을 감추고자 하여 도리어 일본을 환영한다느니 은혜로 안다느니 하는 등 설로 세상에 반포하였으니 스티븐스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수”라고 논하고, 스티븐스를 처단한 의열투쟁을 ‘자유전쟁’이라 명명하였다.
이 의거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1908년 3월 24일·25일 자 1면 톱기사로 보도되며 큰 관심을 끌었다. 1908년 4월 1일자 『공립신문』은 ‘전명운 애국가’를 발표하여 재미한인들의 애국심을 크게 고양하였다. 양의사의 재판을 후원하는 모금운동이 북미·하와이·멕시코 등 미주를 넘어 국내와 일본·중국·러시아 교민사회로 확대되어 8,390달러가 모금되었다. 또한 이상설이 집필한 『양의사 합전(兩義士合傳)』이 발간되어 교민사회에 배포되었다.
1908년 3월 27일 샌프란시스코 경찰법원에서 이른바 ‘살인 미수’로 기소되어 예심에 회부되었다. 증거물로 권총이 제시되었지만 그 권총은 땅에서 주운 것이라 주장하였고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6월 27일 재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결정되어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일제의 감시와 살해 위협이 계속되자, 이름을 맥 필즈(Mack Fields)로 개명하였다. 같은 해 8월 무렵 공립협회 원동특파원으로 임명되어 러시아 연해주로 건너가 재러 한인사회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연해주에 머무는 동안 공립협회 연해주지방 지회 설치에 노력하였다. 이때 연해주지방 학생들에 의해 샌프란시스코 의거가 극화로 만들어져 공연되기도 하였다. 이후 동의회(同義會)에서 활동하였으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안중근을 만나서 일제와의 투쟁방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안중근이 하얼빈 의거로 붙잡힌 후 뤼순감옥에서 신문을 받을 때, “나이는 어렸으나 전명운은 심사가 강정한 청년”이라고 평가하였다.
1909년 10월 미국으로 돌아와 뉴욕에 머물며 노동에 종사하였다. 1910년대 만테카지역에 거주하면서 세탁업과 벼농사에 종사하였다. 1917년 대한인국민회 만테카(Manteca)지방회 실업부원, 1918년 12월 맨티카지방회 회장, 1919년 윌로우스(Willows)지방회 부회장 등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였으며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였다. 3·1절 경축일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애국 강연으로 미주 교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였다. 1920년대에는 프레스노와 리들리에서 포도농장 노동자로 일하였고, 여관업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1937년 가을 이후 철도 건널목 간수로 일하였다.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전시봉사회를 조직하고 군인위문 의연품을 후원하였고, 1942년 2월 로스앤젤레스 한인국방경위대 창설에 참여하는 등 대일전선에 동참하였으며 미군을 후원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