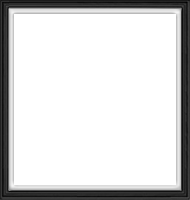| 본문 |
1881년 7월 20일 충청남도 은진군(恩津郡, 현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태어났다. 미국으로 건너가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 등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1907년 7월 한국에서 고종의 강제 퇴위와 대한제국 군인의 강제 해산 등을 계기로 의병이 일어나자, 같은 해 9월 2일 하와이 24개 단체 대표자 30명이 호놀룰루에 모여 합동발기대회를 개최하고 하와이 한인의 통합기관인 한인합성협회(韓人合成協會)를 창립하였다. 한인합성협회가 창립된 다음날인 9월 3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김익성(金翊成)·조병요(趙炳堯)·최병현 등 성공회(聖公會) 교인들과 함께 ‘충성을 다하여 국권을 회복’할 것을 목적으로 전흥협회(電興協會)를 결성하고 창립취지서를 발표하였다. 전흥협회 회원들과 함께 1908년 5월 23일부터 매월 속쇄판으로 『전흥협회보(電興協會報)』를 발행하여 문맹퇴치운동에 공헌하였다. 그 후 전흥협회는 1909년 1월 25일 한인합성협회에 통합되었고, 한인합성협회는 같은 해 2월 북미의 공립협회(共立協會)와 통합하여 재미한인의 통일기관인 국민회(國民會)를 창설하고 하와이지방총회가 되었다.1909년 2월 하와이지방총회 부회장이 되었으며, 2월 8일부터 신한국보사(新韓國報社) 사무원과 재무를 맡아 신문 발송과 재정 출입을 관리하였다. 같은 해 3월 하와이지방총회 산하 푸나후(Punahou) 지방회 평의원, 6월 하와이지방총회 서기 겸 재무로 선출되었다. 8월에는 해산된 상아이야지방회에 시찰로 파견되어 복설(復設)시켰다.1910년 2월 하와이지방총회 임시대의회에서 기관지인 『신한국보』를 쇄신하기 위해 발행과 편집을 분리하자, 발행인에 선임되었다. 7월 손창희·노재호·한재명과 함께 일본 한인유학생 단체인 대한흥학회(大韓興學會)가 일제의 탄압으로 기관지 『대한흥학보』 발행을 못하게 되자, 이를 돕기 위해 「대한흥학회에 대한 권연문」을 발표하고 재정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8월 총회 서기까지 맡아 과로하던 중, 병으로 퀸즈병원에서 복부 수술을 받았다. 9월 호놀룰루지방회와 푸나후지방회가 통합되어 호놀룰루지방회로 개편되자, 호놀룰루지방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0월 지방총회에서 군인양성운동을 위해 연무부鍊(武部)를 두자 연무부 재무가 되었고, 11월 다시 호놀룰루지방회 회장이 되었다.1912년 하와이지방총회 총무로 선임된 데 이어 농상부와 군무부 부원이 되었고, 2월 하와이지방총회 헌장(憲章) 편찬 기초위원이 되었다. 6월 윤병구(尹炳求)와 함께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하와이지방총회 대표원으로 선임되어 11월 8일부터 29일까지 약 20일간 중앙총회 제1회 대표원의회에 참석하였다. 헌장제정, 조국역사 편찬, 교과서 제정, 회기(會旗) 제정 등을 결의하고 박용만(朴容萬)·안창호(安昌浩)와 함께 헌장수정위원이 되었다. 회의 후 박용만에게 『신한국보』 주필을 제의하여, 박용만과 함께 12월 6일 호놀룰루로 돌아왔다.1912년 12월 15일 하와이지방총회 총회장에 선출되었다. 박용만과 함께 하와이 한인 자치제도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여, 자치규정을 기초하여 1913년 1월 27일 발표하였다. 또한 제1차 대표원의회 결의에 따라 회비를 의무금(義務金)으로 바꾸고, 매년 5달러씩 징수하는 의무금 제도로 변경하였다. 같은 해 5월에는 하와이주정부로부터 하와이지방총회를 법인으로 인정받고, 특별경찰권까지 허락받음으로써 자치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하와이 각 섬에 국민회 경찰부장을 설치하였고, 하와이 법정에서도 국민회의 경찰조사와 초심을 법정행사로 인정할 만큼 자치제도가 확립되었다. 8월 기관지 명칭을 『신한국보』에서 『국민보(國民報)』로 개칭하는 것을 승인하였고, 9월에는 세 들어 있던 국민총회관의 주인이 건물을 매도하려고 하자 총회관 건축을 위한 권연문을 발표하고 의연금 모집을 시작하였다.1914년 1월 하와이지방총회 총회장에 당선되었으나, 호놀룰루 팔라마에 있는 한인성공회교회 목사로 부임하기 위해서 사임하였다. 같은 해 4월 한인기독교청년회를 조직하고 부회장 겸 사교부 부원이 되었다.1915년 8월 하와이를 떠나 1920년까지 북미에서 생활하였다. 8월 28일 샌프란시스코지방회에서 국치일을 맞아 연설하였고, 1916년 1월 북미지방총회 총회장 취임식에 참석하였다. 1918년 8월에는 푸에블로지방회에서 ‘국치 제8년’이란 제목으로 연설하였으며, 1919년 1월에는 오하이오주 애크론에 거주하면서 북미지방총회에 지방회 설립을 청원하였고, 같은 해 4월에는 시카고지방회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경축식에서 연설하였다. 이 사이 다양한 의연과 의무금으로 재정 후원에 참여하였다. 1920년 12월 북미를 떠나 하와이로 돌아왔다.1925년 박용만(朴容萬)이 만주 일대에 토지를 구입하여 한인을 이주시킬 목적으로 저축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자, 저축회사 설립위원 겸 이사로 활동하였다. 1928년 2월 호놀룰루에서 하와이대한인교민단과 대조선독립단이 합동하여 대한민족통일회를 조직하기로 의결하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중립파로 참여하여 준비위원회 회장이 되어 통일회를 창립하고 의사부 위원으로 선임되었다.1930년 1월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당 통일을 목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29인과 함께 취지서를 발표한 뒤 2월 이들과 함께 한인협회를 창설하고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931년 1월 『태평양주보(太平洋週報)』의 재무가 되었고, 4월에는 동지회 중앙부장으로도 활동하였다.1934년 6월 하와이국민회(이하 국민회)의 총무로 선임되어 국민회관 건축을 위해 힘썼고, 10월에는 대조선독립단과 국민회의 합동축하회를 주관하였다. 1935년 2월 다시 국민회 총무로 선임된 데 이어, 국민회에 참의회를 설치하자 참의원으로도 추대되었다. 10월에는 국민회와 동지회의 통합을 위해 동지회 대표들과 만나 합동을 조율하였다. 1936년 1월 국민회 총무로 선임되었고, 2월까지 『국민보』 주필로 활동하였다. 같은 해 12월 국민회 총회장 후보에 추천되었으나, 사양하였다.1937년 2월 국민회 역사편찬 사료수집위원으로도 선정되었으며, 3월경 참의원을 사임하였다. 같은 해 7월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8월 국민회가 하와이 한인을 규합하여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군사운동을 적극 후원하기 위해 찬무회를 조직하자, 찬무회 산하 기밀부 부원이 되었다. 9월 임시정부에서 국민회에 군자금 저축, 군인 확보와 군사훈련 실시 등에 관한 서신을 보내오자, 국민회에서 개최한 국민대회에 참여하여 ‘준비의 필요’에 대해 연설하였다. 10월 국민회 총임원회에서 참석하여 임시정부 중심의 독립운동을 후원하기 위한 동지회와 국민회간의 통합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통합교섭의원으로 선임되어 통합운동에 진력하였다. 1940년 12월 한인상업회를 조직하고 서기로 활동하였다.한편 중한민중동맹단(中韓民衆同盟團)에서 1942년과 1943년 이사부원, 1943년 서기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중한민중동맹단 내부의 갈등으로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민찬호 등과 함께 중한민중동맹단을 탈퇴하였다. 이어 조선민족혁명당 하와이총지부를 조직하고 통신서기가 되었으며, 1944년 1월 중앙집행위원이자 조직부장으로 선임되었다.같은 해 8월 임시정부에서 주미외교위원부 재조직을 지시하자, 조선민족혁명당 하와이총지부에서 현순 등과 교섭위원회를 구성하고 서기가 되었다. 9월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서 8개 단체, 24인 대표가 모여 주미외교위원부 재조직 문제를 논의할 때, 민족혁명당 대표로 현순·홍한식과 함께 참석하여 준비위원이 되었다. 10월에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9개 단체 대표들이 모여 주미외교위원회 재건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단결·군사 원조·외교 정책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때 하와이 재미한족연합위원회(United Korean committee in Hawaii) 의사부 집행위원장으로 당선되어 외교위원회 인선을 단행하였다. 같은 달 「경애하는 애국동지 앞에」와 「애국동포에게 호소함」을 발표하여 전민족의 역량을 통일하여 임시정부 독립운동의 실력을 강화할 것이고, 군사공작을 실제에 촉진하여 절대 독립을 완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1945년 1월 국민보사 편집부원으로 선정되었고, 3월에는 하와이 한족연합회 위원장으로 시국대회를 개최하고 샌프란시스코회의 참석을 준비하며 조선대표단을 선정·파견하는데 힘썼다.가족에 대해 알려진 바는 적지만, 1942년 4월 24일 부인이 호놀룰루에서 사망하였고 1943년 8월 아들 존슨은 보병대 하사, 3남 윌슨은 탱크부대에서 근무하였다 한다. 또한 1945년 4월 2남 엘손이 정교로서 프랑스 전선에서 전투 중 독일군 포로가 되었고, 8월에는 윌슨이 부교로 종군하다 이탈리아 전선에서 독일군 포로가 되었다가 독일의 항복 후 석방되어 미국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었다.광복 후 1945년 12월 국민보사 편집부에서 근무하였고, 1949년 7월 하와이독립당의 김구선생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낭독하였다.대한민국 정부는 200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