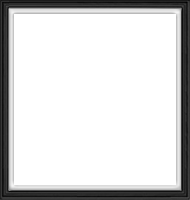| 본문 |
충청북도 충주군(忠州郡) 덕산면(德山面) 출신이다. 자료에 따르면 1882년생으로 추정된다. 이명은 다른 한자의 채찬(蔡贊)과 백광운(白狂雲·白光雲), 백왕운(白旺雲), 백채찬(白蔡燦)이다. 의병전쟁에 참여해 구국운동을 벌였고, 경술국치를 당하자 서간도로 망명해 1910년대 독립운동기지 건설에 앞장섰다. 이후 서로군정서·통의부·참의부 등에서 독립군 지휘관이 되어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1905년 일제에 의한 을사늑약의 강압으로 나라의 외교권을 뺏기자 의병장 이강년(李康秊)을 따라 경북 문경(聞慶)에서 거의했다. 전기의병에서 활약하다가 소백산중에서 의병부대를 해산했던 이강년은 을사늑약이 강압되자 의병들을 다시 소집해 침략자 일제를 몰아내기 위한 항일 구국전을 재개했다. 이강년의진은 1907년 광무황제의 강제 퇴위 및 군대해산으로 다시 발흥된 후기의병 이후까지 계속 원주·제천·문경·단양·영월·가평·인제 등을 무대로 일제와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1908년 7월 2일 의병장 이강년이 제천 금수산의 작성전투에서 적의 탄환을 맞고 피체되면서 의진은 해산되었다. 이같이 해산될 때까지 이강년의진의 일원이 되어 수년간 항일전에 참가하였다.
1910년 8월 일제에 의해 국권이 완전 상실된 경술국치를 당하자, 압록강을 넘어 서간도로 망명했다. 서간도 유하(柳河)·통화현(通化縣) 지역은 1910년 전후부터 국내 항일 비밀결사인 신민회(新民會)계통의 민족운동자들이 주도해 국외 독립운동기지로 건설하고 있던 지역이었다. 처음 독립운동기지 개척이 시작된 지역은 유하현 삼원포(三源浦)였다. 하지만 1911년 겨울 혹독한 추위와 풍토병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본 후, 이듬해 통화현 합니하(哈泥河)로 옮겨 기지 건설이 이어졌다. 이 서간도 독립운동기지에는 국내에서 많은 한인들이 이주해 왔고, 민족운동자들은 이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했으며, 학교를 설립해 2세들을 교육시켰다. 특히 장차 목표로 한 독립전쟁을 위해 무관학교를 설립해 독립군을 양성시켰다.
통화현의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했으니, 1912년 이후 망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관학교 졸업 후, 통화현 팔리초(八里哨) 소북차(小北岔)에 설립된 백서농장(白西農庄)에서 독립군 무관을 양성했다. 1914년 설립된 백서농장은 일제나 중국측이 알 수 없도록 농장이란 이름을 붙였지만, 곧 실전에 투입시킬 수 있는 독립군을 양성하는 무관학교 이자, 독립군단(獨立軍團)의 편제를 갖춘 군영(軍營)이었다. 장주(庄主)는 김동삼(金東三)이었고, 총무 김정제(金定濟), 훈독(訓督) 양규열(梁圭烈), 교관 허식(許湜, 이명 : 허영백[許英伯])·김영윤(金永胤)·김동식(金東植)·강보형(康保衡) 등이었고, 그는 농감(農監)으로 재직했다. 실전에 대응할 수 있는 독립군단이 편성되어 제 1중대장에는 안상목(安相睦), 2중대장은 박상훈(朴相薰), 3중대장은 김경달(金敬達) 등이 임명되었다.
이같이 서간도 독립운동기지에서 일제를 상대로 한 독립전쟁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때, 1919년 3월 1일 전민족적인 독립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서간도지역의 이주한인사회와 독립운동기지에서도 이에 호응해 3월 12일부터 적극적인 만세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그 열기를 집중시켜 1919년 4월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기구인 한족회(韓族會)를 성립시켰다. 한족회는 독립운동기지 건설 기간인 약 10년간 유하·통화·해룡(海龍)·흥경(興京)·임강(臨江)·집안(輯安)·환인현(桓仁縣) 등에 조직되었던 부민단(扶民團)을 비롯해 자신계(自新契)·교육회(敎育會) 등 자치단체를 통합시켜 만든 것이었다. 따라서 서간도 전체의 한인사회를 하나의 통합된 독립운동 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다. 한족회는 이같이 서간도 한인사회를 총체적으로 아우르고, 그를 바탕으로 군정부(軍政府)를 건립했다. 그러나 그 해 4월 11일 상하이(上海)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임시정부 인사들과 협의해 군정부를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로 개칭하고, 무장활동을 수행할 독립군단 편제를 갖추었다. 서로군정서는 본부를 유하현 고산자(孤山子)에 설치했다.
서로군정서가 성립되자 곧바로 의용군 제1중대장에 임명되었다. 그 외 다른 간부진은, 독판(督辦) 이상룡(李相龍), 부독판 여준(呂準), 참모부장 김동삼 이었고, 의용군을 책임질 사령관은 지청천(池靑天)이었다.
국내에서 의병부대에 가담해 무장활동을 벌였고, 서간도 망명 후에는 무관교육을 수료하고, 병영의 간부로 활동하는 등, 무관으로서 심도있는 경험을 쌓았기에 능력있는 독립군 간부 역할을 할 수 있었다. 1중대 중대장으로서의 역할 이외 서로군정서 의용군의 핵심 멤버중의 한 명인 신광재(辛光在)와 1919년 음력 11월 압록강변인 집안현 추피구(楸皮溝)에 암살대를 조직했다. 십여 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진 암살대의 구성원들은 모두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독립군들이었다. 실체를 은폐하기 위해 대원들 간에는 ‘기관(機關)’이라 불린 이 단체는 한국내로 진입해 유격전을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 특공 조직이었다. 대장은 신광재였지만, 암살대의 중요 사항은 항상 두 사람이 협의하여 결정했다.
암살대의 활동사항을 보면, 1920년 1월 정훈철(鄭勳哲)·이창덕(李昌德) 두 대원이 한 조를 이루어 평북 자성군(慈城郡) 조아동(照牙洞)으로 진입했다. 이들은 조아동에 거주하며 한국인들을 무수히 괴롭히고 착취한 일본인 나가미 간타로(永見寬太郞)의 집을 습격해 즉석에서 처단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정훈철·이창덕이 함께 한 수명의 대원들이 자성군 삼흥면(三興面) 서해동(西海洞)으로 진입했다. 대원들은 삼흥면 면사무소로 진입해 면서기를 진압한 후, 면민들로부터 착취한 적지 않은 돈을 군자금으로 회수했다. 이밖에도 암살대 대원들은 자성군 자작령(自作嶺)에서 현금수송 우편차를 습격해 자금을 확보하는 등 강계와 자성군을 무대로 친일부호 및 일본인들의 집을 습격해 많은 군자금을 거둬들였다. 이 같은 활동으로, 성립된 지 약 6개월 만에 확보된 자금이 천 3백 5십원이나 되었다. 이 금액은 대원들의 식비를 뺀 전액이 신흥무관학교의 운영비로 납부되었다.
그가 속한 서로군정서뿐만 아니라 3.1운동 후 서북간도에 성립된 수십 개의 독립군단들이 만주는 물론이고 한국내로 진입해 이 같은 활동을 벌여, 일제에 큰 피해를 입혔다. 이에 일제는 독립군뿐 아니라 서북간도 한인사회 자체를 초토화 시키고자 1920년 8월 ‘간도지역불령선인초토계획(間島地域不逞鮮人剿討計劃)’을 세웠다. 그리고 그 해 10월 2일부터 약 2만 명의 일본군을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서북간도를 향해 침입시켰다. 일본군의 침입을 사전에 간파한 독립군들은 백두산록 서쪽으로 근거지를 옮기는 피전책(避戰策)을 쓰다가, 1920년 10월 20일부터 10여 일간 화룡현(和龍縣) 청산리(靑山里) 일대에서 일본군 천여 명을 사살하는 대첩을 이루기도 했다. 이후 대부분의 독립군들은 북만주의 밀산(密山)을 거쳐 소련의 연해주로 이동했다. 청산리대첩 후 일본군들은 더욱 발악하며 독립군근거지 및 한인사회를 초토화시켰다. 순식간에 3천 7백 명의 독립군 및 한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3천 3백 채가 넘는 한인의 가옥·학교·교회 등이 불에 타 없어졌다.
서로군정서의 경우, 일부는 사령관 지청천이 이끌고 소련의 연해주까지 이동했지만, 다른 독립군단 보다는 잔류 병력이 많았다. 서간도에 잔류한 독립군들은 주변의 산간오지로 피신해 일본군의 만행을 모면했다. 그리고 일본군이 철수하자 다시 근거지로 모여들었다. 병사들이 모여들자 파괴된 병영을 재건축하는 한편, 1921년 2월 그들을 무장시키기 위해 소련 연해주로 이동한 대한독립군(大韓獨立軍) 사령관 홍범도(洪範圖)에게 사람들을 보내 무기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범도는 5월 중순, 장총과 권총 및 탄약 등을 보내주었다.
준비가 갖추어지자 이화영(李化榮)·차천리(車千里) 등과 진용을 갖추는 작업을 추진했다. 암살대장으로 뛰어난 지휘력을 보였던 신광재는 불행하게도 이 조직을 편성하기 얼마 전 병을 얻어 임강현 홍토애(紅土崖) 병영에서 운명했다. 사령부가 연해주로 이동했으므로 새로 사령부는 설치하지 않고, 중대의 규모를 크게 해 그 내부에 행정조직까지 갖추었다. 이번에도 1중대장을 맡았으며, 경리부와 행정부를 편성해 김소하(金篠廈)와 뱍태호(朴泰浩)를 임명했다. 중대본부를 집안현 유수림자(楡樹林子) 두도구(頭道溝)에 두고 하부에 3개 소대를 편성했다. 제1소대(소대장 김흥룡[金興龍])는 집안현 태평구(太平溝) 립석차산(砬石岔山) 및 유수림자 5도구 북쪽에 나누어 주둔시켰다. 제2소대(소대장 전봉도[田奉道])는 집안현 태평구·외양자구(外楊子溝) 및 태반차(太盤岔) 부근에 나누어 주둔시켜, 중대본부와 3소대를 서로 연결시키는 임무를 주었다. 제3소대(소대장 현기전[玄基甸])는 집안현 소청구(小淸溝) 옥명하(玉名河)·대청구(大淸溝)·태평구 등에 분산해 주둔하도록 했다. 이화영이 지휘하는 제2중대는 통화현 7도구에 본부를 설치하고 3개 소대를 편성해 통화와 임강현에 주둔시켰다.
1921년 후반기에는 서로군정서 의용군의 체제를 다시 재조정하였다. 여러 중대를 만들고, 그 밑에 소대들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독립군의 인원이 너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10여 년간 체계적으로 구축된 독립운동기지를 기반으로 해 성립된 서로군정서였지만, 경신참변을 겪는 과정에서 많은 인원이 희생되거나 이탈되고, 기지 또한 복구하기 힘들 정도로 파괴되었다. 게다가 기지 건설에 앞장섰던 민족운동계 지도자들은 세월이 흐르며 많이 노쇠해져 무장활동이라는 격렬한 독립운동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러한 이유로 조직을 마치 실전을 위한 특공대 같이 단순하게 편성했다. 60세를 훨씬 넘겨 노인이 된 독판 이상룡을 대신해 2중대 1소대장이었던 차천리가 독판대리를 맡았다. 그리고 내무반장에는 권승무(權承武)가 되고, 자신은 외무반장을 맡았다. 이시기부터 서로군정서 의용군 병력을 한 군데로 모아 통화현 7도구에 주둔했다.
서간도를 포함한 남만주의 여러 독립군단들도 서로군정서와 마찬가지로 근거지를 정비하고, 생존한 독립운동 요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한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다 1922년 봄,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광한단(光韓團) 및 서로군정서 일부 등이 통합해 대한통군부(大韓統軍府)를 결성했다.
서로군정서 일부가 그에 동조해 가담했지만, 통화현에서 막 의용군을 재정비한 때라 함께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군정서와 한족회의 내부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공문을 각 지역 지방조직의 책임자인 총관(總管)들에게 보냈다. 그와 함께 한국 독립운동의 필연성을 대외에 더욱 선전한다는 의지에서 1922년 5월 임시정부에서 간행하는 『독립신문』의 간행 주최들에게 지원금을 보내기도 했다. 당시 독립신문사는 자금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독립신문사는 이 지원금으로 중국어판을 만들어 중국 각 성(省)의 관공서·학교 및 단체들에게 무료로 배포하였다.
그런데 통군부를 결성한 민족운동자들은 서로군정서 잔여 세력 및 남만주지역 독립운동 단체들에게 통합에 가담하도록 계속 설득해 왔다. 결국 그들의 설득이 합리적이라 판단해, 그해 8월 23일 남만주의 모든 독립운동 세력을 통합시키기 위해 환인현 마권자(馬圈子)에서 개최된 남만한족통일회의에 김선풍(金旋風)·김소하(金篠廈)·백태호(朴泰浩)·이범천(李範天)·성오관(成午觀)·김해운(金海運)·한응열(韓應烈)·유상엽(劉尙燁) 등과 서로군정서 대표로 참석했다.
서로군정서·대한광복군총영(大韓光復軍總營) 등 17개 독립운동단체 대표 71명이 모여 김승만(金承萬)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약 6일간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 그 결과, 남만주 전체를 통합시킨 독립군단인 대한통의부(大韓統義府)를 성립시켰다. 회의에서는 6개의 결의사항이 채택되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첫 번째 “각 단체 각 기관의 명의(평북연통제[平北聯通制]는 제외)를 취소하고 구역 인물 및 재정을 하나로 통일하고, 제도·인선(人選) 및 제반 사항은 무조건 공결(公決)로 복종한다는 조건에 서명 날인하고 서약한다.”였다. 즉 통합이전 각 단체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통의부내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체제 및 질서에 절대 복종해 오직 조국 독립만을 위해 앞으로 나간다는 선언이었다.
그 선언에 입각해 조직을 편성하고, 통의부 헌장을 제정해 통과시켰다. 중앙조직은 총장제를 택해, 총장에 김동삼, 부총장에 채상덕(蔡相悳)이 선임되고, 그 밑으로 참모·민사·교섭·군사·법무·재무·학무·권업부 등 8개 행정부서와 사법기관인 사판소와 입법기관인 중앙의회가 설치되어 3권 분립 체제를 갖추었다. 그리고 남만주지역내 산재한 한인사회를 관할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에 따라 총관, 구(區)등을 설치한 지방조직을 만들었다.
항일 독립전쟁 수행을 위해 편성한 의용군은 김창환(金昌煥)이 사령관에 선임되고, 1개 대대, 5개 중대 및 유격중대와 헌병대가 설치되고 각 중대 밑에는 3개 소대를 두었다. 적극적 무장투쟁론자였기에 서로군정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제1중대 중대장에 선임되었다. 그 밑에는 제1소대(소대장 김보국[金保國])·2소대(소대장 : 전봉도[田奉道])·3소대(소대장 김기준[金基準])가 편성되었으며, 100여명의 병력과 인원에 맞춰 100여정의 무기를 갖췄다. 1중대뿐만 아니라 다른 중대들도 100명 이상의 병력에 충분한 무장력을 보유했다.
경신참변 후, 서로군정서 시기보다 훨씬 많은 병력과 월등한 무장력을 갖추게 된 통의부 의용군은 활발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다. 1922년 12월에는 만주까지 이주해와 일제에 협조해 독립군의 무장활동을 방해한 친일의 무리를 척결하기 위해 3개의 유격대를 편성했다. 제1대는 장춘(長春)에서 북만주의 영고탑(寧古塔)까지, 제2대는 장춘에서 대련(大連)까지, 제3대는 심양(瀋陽)에서 안동현(安東縣)까지 구획을 정해, 친일파로 사전에 조사된 자들을 찾아다니며 소탕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이끄는 제1중대 소속의 이화주(李化周) 부대는 1924년 2월 20일 평북 강계군 문흥경찰서 문악출장소를 습격해 일제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철수했다.
그런데 통의부는 성립된 그 해 10월 복벽주의계열인 검무국장(檢務局長) 전덕원(全德元)계의 인사들과 공화주의계인 양기탁(梁起鐸)·현정경(玄正卿)계 인사들이 갈등을 일으켜 인명이 희생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념과 노선을 무시하고 오직 조국을 독립시키는 일에만 집중하자는 창립시 약속이 무산된 것이다. 결국 양측이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1923년 2월 전덕원계가 의군부(義軍府)를 설립해 통의부를 떠나고 말았다. 통합을 이룬지 불과 몇 달 만에 또 다시 분리된 것이다. 중앙의 행정조직 소속이 아닌 의용군 중대장인 군인신분이었지만, 양측을 화해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남만주의 사정이 이러할 때, 한국독립운동계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임시정부의 방향제시를 위해 1923년 1월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각계 각지의 대표들이 모여 약 5개월간 개최된 이 회의에서 새로운 임정을 만들자는 창조파와 현재 정부의 잘못된 점을 고쳐 계속가자는 개조파간의 타협점이 이루어지지 않아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끝났다. 그는 개조파를 지지하였기에 서간도, 북간도, 길림성의 독립운동 지도자 78명과 연서하여 1923년 5월 ‘창조파의 주장은 정부의 역사를 말살하려는 행위’라는 성토문을 발표하였다.
만주 독립운동계 뿐 아니라 다른 여러 계열에서도 한국독립운동계는 일치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비록 현재의 임시정부가 모든 독립운동계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나 한민족(韓民族)의 구심점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만주독립운동계의 활로를 찾기 위해, 1923년 말 뜻이 맞는 김원상(金元常)·박응백(朴應伯) 등과 상하이의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해결점을 찾기 위해 임정의 여러 인사들을 만나 논의도 해보고,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선출되어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는 의원들과 상론도 했다.
그같이 만난 여러 인사들의 의견을 종합 해 내린 결론은, 임시정부 직속의 무장투쟁 단체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럴 경우 임정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며, 만주의 독립군단은 정부를 지지대 삼아 더욱 충실히 항일무장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결론을 내린 후, 남만주로 돌아 와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의용군지휘관 77명과 함께, 1924년 4월 임시정부 직속의 통일된 독립군단을 만들자는 ‘선언서’를 발표했다. 이 선언서가 발표되자 통의부 중앙조직의 인사들은 크게 당황했다. 임정 직속의 독립군단을 만든다는 것은 통의부를 이탈한다는 내용이었다. 복벽주의 계열이 의군부를 조직해 이탈했는데, 또 다시 의용군이 임정 직속의 독립군단으로 분리돼 나가면, 독립전쟁을 목표로 한 단체로서는 세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미 결심한 의용군 지휘관들의 행동은 막을 수가 없었다. 선언서에 서명한 인물들은 통의부 의용군 제1·2·3 중대와 유격대 및 독립소대 대표들이었다. 이들은 5월에 임시정부 기치 아래 모이자는 선언서를 또 다시 발표하고 통의부에서 떨어져 나와 대한민국임시정부 육군주만참의부(陸軍駐滿參議部)를 성립시켰다. 이어 6월에는 김명봉(金鳴鳳)이 이끄는 제5중대도 참의부에 가담했다.
참의부 성립을 주도했으므로 초대 참의장 겸 제1중대장의 직을 맡았다. 성립 초기 참의부는 5개의 중대와 독립소대, 훈련대 등의 무장활동 조직과, 행정을 실시할 민사부(民事部), 입법기관인 중앙의회 등의 기구를 갖췄다. 8개의 행정조직 및 사법기관까지 갖춘 통의부에 비하면, 무장조직 위주로 짜인 훨씬 간소화 된 편제였다.
본부와 각 중대를 압록강변인 집안현에 집중시키고, 환인현(桓仁縣)과 통화현 오지에 일부를 배치했다. 조직의 편제와 그 배치에서 알 수 있듯이, 참의부는 한국내 진입 무장활동에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가졌다. 따라서 일제는 참의부 성립 초기부터 이 독립군단과 그 구성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주의를 기울였다.
성립되고 곧, 일제의 경계가 단순히 우려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참의부의 공격이 이루어졌다. 1924년 5월 19일 아침 9시 20분경, 국경순시를 나온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가 탄 배가 중국의 집안과 한국의 위원 사이 압록강을 지났다. 사전에 이 행사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부하 장창헌(張昌憲)을 대장으로 한 8명이 유격대를 조직하도록 했다. 유격대는 총독이 도착하기 전 위원군 대안의 험준한 낭떠러지 위 바위 뒤에 매복했다. 그리고 총독이 탄 배가 나타나자 일시에 집중사격을 감행했다. 순식간에 당한 공격에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해보고, 총독이 탄 배와 호위선은 줄행랑을 쳤다. 유격대의 공격으로 총독을 처단하지는 못했지만, 식민지 한국을 지배하는 최고 권력자가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에 일제는 아연했으며, 참의부 독립군들에 대해 더욱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로도 국경지방인 평북 강계·후창·자성·구성군 등을 무대로 참의부 유격대의 활동은 끊이지 않았다.
참의부 독립군들은 일제를 상대로 활발한 무장활동을 벌였지만, 내부적으로는 통의부와의 대립관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많은 지휘관들과 독립군들이 참의부로 떠나고 얼마 되지 않은 세력만 통의부에 남았다. 통의부 잔류세력들은 여러 번 참의부측에 회기를 권유하다 마침내는 양측이 무력 충돌하는 상황까지 갔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1924년 9월 14일 새벽, 집안현 본부에 머물러 있던 중, 급습한 통의부 대원들이 쏜 총을 맞고 말았다. 그리고 그 날 오전 8시 운명해 순국하였다.
그의 운명은 곧 참의부장 대리 심용준(沈龍俊)과 참의부원 일동 명의로 전 독립운동계에 부고(訃告)가 나갔다.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과 미주의 『신한민보』 및 『구미위원부 통신』도 부고와 함께 논설을 게재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