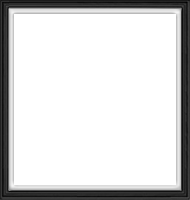| 본문 |
1904년 중국 광둥성(廣東省) 광저우(廣州) 출신이다. 독립운동가 김성숙(金星淑)의 아내이다. 1924년 광둥대학(廣東大學)에 입학하였는데, 광둥대학은 1924년 2월 쑨원(孫文)이 설립한 학교로 1926년 그의 호를 따 중산대학(中山大學)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1927년 12월 국민당 장제스(蔣介石)가 반공쿠데타를 일으켜 제1차 국공합작(國共合作)이 결렬되고 중국공산당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자, 공산당이 무장봉기를 일으켜 광저우를 점령한 광저우봉기가 일어났다. 김성숙·오성륜(吳成崙)·김산(金山) 등 200명이 넘는 한인 청년이 참가하였다. 광저우봉기가 ‘3일 천하’로 끝나자, 김성숙과 함께 중산대학 기숙사에 남아있던 한인 학생들의 광저우 탈출을 도왔고, 김성숙을 숨겨주어 공산당원 박해를 피하게 하였다. 1928년 초 김성숙과 같이 홍콩을 경유하여 상하이(上海)로 탈출하였고, 이듬해 김성숙과 결혼하여 슬하에 세 아들을 두었다.
1930년 8월 김성숙과 함께 중국공산당 산하 혁명문학운동단체인 중국좌익작가연맹에 가입하였다. 1932년 10월부터 1934년 5월까지 광시성(廣西省) 구이린(桂林)의 광시사범대학(廣西師範大學)에 머물며 『교육병리학』 등 일본 학술서적 번역 작업에 참여하였다. 아울러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중국사회의 여성문제를 분석한 글들을 발표하였고, 1935년에는 월간 『부녀생활(婦女生活)』을 창간하였다. 『부녀문제강좌(婦女問題講座)』를 비롯한 여성문제 관련 책을 저술하여, 여성이 억압받는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고 여성해방의 길을 제시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1935년 12월 12일에는 상하이의 중국좌익작가연맹 및 문화계 인사와 연명으로 「상해문화계 구국운동 선언(上海文化界救國運動宣言)」을 발표하여 중국문화계의 항일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같은 달 설립된 상해부녀구국회(上海婦女救國會) 조직부장을 맡아 상하이 여성들의 항일운동을 이끌었다. 김성숙도 이 단체에 가입하여 아내의 활동을 도왔다. 이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훗날 전국각계구국연합회(全國各界救國聯合會) 이사에 선임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후베이성(湖北省) 우한(武漢)으로 가서 조선민족전선연맹(朝鮮民族戰線聯盟) 소속 한인 독립운동가들과 한 집에서 생활하였다.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 정치부의 지휘 아래 전시고아원(戰時孤兒院)을 설립해, 부모를 잃은 고아와 빈아(貧兒)들을 보살폈다. 이 전시고아원은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기관지 『조선민족전선(朝鮮民族戰線)』 을 편집⋅출판하는 아지트 역할도 겸하였다. 일본군이 우한을 포위해 오자 고아원의 아동들을 데리고 충칭(重慶)으로 이동하였다.
충칭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가한 김성숙을 따라 한국독립운동에 합류하였다. 중한문화협회(中韓文化協會) 발기인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1943년 2월 3일 임시정부 외무부 부원에 임명되어, 4월 2일부터 같은 해 9월 28일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부 정보과에서 근무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애국부인회(韓國愛國婦人會) 중앙집행위원, 한국구제총회(韓國救濟總會) 이사 등으로도 활동하였다.
중국공산당 지도자 중 한 명인 저우언라이(周恩來)의 아내이자 여성운동의 리더였던 덩잉차오(鄧潁超)와 친분이 두터웠으므로, 김성숙도 저우언라이를 비롯한 중국공산당 간부와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 이외에도 김성숙이 중국 측 인사들과 교류하고 한·중 연대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한국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도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확고한 주장을 갖고 있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 발간된 『독립』 신문에 실린 글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위해 독립운동가들을 ‘후원’하는 일이 가장 절실하며, 이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여성들이 솔선하여 다른 나라 여성들과 연합할 것을 역설하였다. 이렇듯 한국독립운동에 참여하면서도 1944년 월간지 『직업부녀(職業婦女)』를 창간하였고, 1945년에는 중국부녀연의회(中國婦女聯誼會) 상무이사를 역임하는 등, 중국 여성운동과 문화운동의 끈도 놓지 않았다.
‘조선의 딸’을 자처하며 한국독립운동에 헌신해 왔지만 1945년 8월 15일 광복은 남편 김성숙과 생이별하는 시간이 되었다. 1945년 11월 5일 김성숙은 충칭을 떠나, 1945년 12월 1일 임정요인 제2진의 일원으로 귀국하였다. 당시 12살이었던 ‘둘째 아들이 1945년 12월 말에서 이듬해 1월 초에 걸쳐 복막염으로 입원 치료를 했다’는 후일의 편지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세 아들과 함께 중국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1945년 중국부녀연의회(中國婦女聯誼會) 상무이사를 지냈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에는 중등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 중국공산당 8차대회 대표 등으로 활동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6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