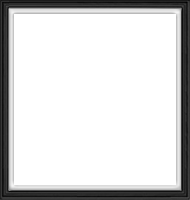| 본문 |
1908년 7월 15일 중국 지린성(吉林省) 허룽현(和龍縣) 용정(龍井)에서 연병환(延秉煥)과 김정숙(金貞淑)의 1남 1녀 중 맏딸로 태어났다. 본관은 곡산(谷山)이며, 본명은 연충효(延忠孝), 호는 미당(薇堂)이다. 1938년부터 ‘연미당(延薇堂)’이라 불렸다.부친 연병환은 관립외국어학교를 졸업하고 1897년 궁내부주사로 임명되었다. 이후 인천·부산의 해관방판(海關幇辦) 등으로 근무하다가 1907년 정미7조약이 체결되자 사직하였다. 1907년 북간도로 건너가 용정해관에 취직하였다. 고향인 충청북도 증평(曾坪)에 처자식을 두고 용정에서 중혼한 뒤 1908년 7월 15일 연미당을 낳았다.1919년 3월 13일 용정에서도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부친이 ‘배일선인(排日鮮人)’으로 지목되어 일본의 압박이 심해졌다. 중국 정부는 연병환을 상하이(上海) 해관으로 전출시켜주어 1920년 초 상하이로 이주하였다.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립학교인 인성학교(仁成學校)를 졸업하였다. 부친이 장쑤성(江蘇省) 전장(鎭江) 해관으로 전근되자, 전장의 숭실여자중학교(崇實女子中學校)를 다녔다. 1926년 5월 14일 중국 허난성(河南省) 하남군무독판공서(河南軍務督瓣公署)에 재직하던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가족은 상하이로 이사하였다.1927년 3월 20일 20세 나이로 독립운동가 엄항섭(嚴恒燮)과 결혼하였다. 슬하에 2남 3녀를 두었다.1930년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이 창당되자 남편 엄항섭과 함께 한국독립당의 청년활동에 진력하며 임시정부 활동을 지원하였다. 1930년 8월 16일 상해여자청년동맹(上海女子靑年同盟)에 가입하였고, 1932년에는 5명의 임시위원의 중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다. 1931년 7월 ‘만보산사건’을 계기로 한·중 반일 공동전선(韓中反日共同戰線)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단체들이 모여 상해한인각단체연합회(上海韓人各團體聯合會)가 출범하였다. 이때 상해여자청년동맹 대표로 참여해 의연금 모금을 맡았다. 1932년 1월 일본군이 상하이를 침공하자 중국군 19로군의 부상병사에게 위문품을 보내는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매년 8·29 국치기념일에는 「국치 기념(國恥紀念)」 전단을 제작·배포하였다.1932년 4월 29일 윤봉길(尹奉吉)의 홍커우공원 의거가 일어나자 남편과 함께 상하이를 탈출하였다. 상하이를 떠난 후 자싱(嘉興) 매만가(梅灣街)에 있는 추푸청(褚補成)의 수양아들 천퉁성(陳棟生) 집에 피신해 있던 김구(金九)와 폐결핵에 걸려 위중한 상태였던 이동녕(李東寧)을 간호하며 피신 생활을 하였다. 한편 난징(南京)으로 피신한 남동생 연충렬이 밀정 혐의로 1933년 1월 처단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일본군의 공세가 심해진 난징에서 둘째 아들 엄기남(嚴基南)을 출산하였다. 이후 임시정부가 피신해 있는 후난성(湖南省) 창사(長沙)로 탈출하여 1938년도 3·1절 기념식을 성대하게 치렀다. 1938년 3월 10일 안창호(安昌浩) 서거 소식이 창사에 전해지자 임시정부 주최 ‘안창호 서거 추도회’를 준비하였고, 도산을 추모하는 애도가를 불렀다.1938년 5월 6일 창사 남목청(楠木廳) 6호 조선혁명당(朝鮮革命黨) 본부에서 조선혁명당·한국독립당·한국국민당(韓國國民黨) 3당 대표들의 통일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 도중 자리에 난입한 이운한(李雲漢)이 권총을 난사해 현익철(玄益哲)이 즉사하고, 김구(金九)는 중상을 입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김구는 즉시 상아의원(湘雅醫院, 현 중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옮겨졌다. 응급 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진 김구를 집으로 옮겨 정성스럽게 간호하였다.1938년 10월에 결성된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韓國光復陳線靑年工作隊)에 맏딸 엄기선(嚴基善)과 함께 참가하였다.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에서 일본군 정보를 수집·보고하고 중국의 선전공작대와 함께 선전·홍보활동을 벌였다.1939년 임시정부가 치장(綦江)에 도착한 뒤 1940년 5월 9일 한국국민당·조선혁명당·한국독립당이 통합하여 한국독립당을 창당하였다. 한국독립당 중앙조직부 제2구(區)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1940년 9월 임시정부가 충칭(重慶)으로 이동하기 전 가족과 먼저 충칭에 도착하였다.1943년 2월 23일 각 정파의 여성들 50여 명이 모여 한국애국부인회(韓國愛國婦人會)를 재건하면서 조직부 주임을 맡았다. 한국애국부인회는 3·1운동 이후 국내는 물론 미주와 상하이 등지에서 결성된 애국부인회의 애국 활동을 계승하여, “총단결하여 전민족 해방운동과 남녀평등이 실현되는 민주주의 신 공화국 건설에 적극 참여하여 분투하자”는 행동 강령을 선포해 국내외 여성들에게 독립운동의 참여를 호소하였다.1944년 중국 국민당 정부와 임시정부 간의 협조로 대적선전위원회(對敵宣傳委員會)가 결성되었다. 한국애국부인회 일원으로서 반일의식을 고취하는 방송과 국내외 여성 동포들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선무 방송을 하였다. 중국 전선에 끌려온 일본군 소속의 한적(韓籍) 사병들에게는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韓國光復軍)의 활동 상황을 알리며, 광복군 진영으로 탈출을 유도하는 한국어 방송을 하였다. 한국애국부인회 여성들과 함께 항일전선의 군인들을 위문하였다. 충칭 투차오(土橋)에 소재한 일본군 포로수용소를 방문하여 향수와 애국심을 자극하는 공연을 펼치고 포로가 된 한적 병사들의 광복군 편입을 권유하는 초모공작도 전개하였다.충칭 한인사회에 종전 후 ‘신탁통치’ 소식이 전해졌다. 1943년 5월 10일 한국애국부인회를 비롯한 한국독립당·조선민족혁명당(朝鮮民族革命黨)·조선민족해방동맹(朝鮮民族解放同盟)·무정부주의연맹(無政府主義聯盟)·한국청년회(韓國靑年會) 등 좌우익 6개 대표 정당 및 단체 공동으로 재중국자유한국인대회(在中自由韓國人大會)를 개최하였다. 당시 한국애국부인회 대표로 참석하였다. 한국독립당의 홍진(洪震), 조선민족혁명당의 김충광(金忠光), 조선민족해방동맹의 김규광(金奎光), 무정부주의연맹의 유월파(柳月波), 한국청년회의 한지성(韓志成) 등과 함께 주석단(主席團)의 일원으로 추대되어 어떤 외세의 압박과 간섭도 반대할 것을 결의하고, “한국은 마땅히 독립국이 되어야 하고, 한민족은 마땅히 자유민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자유한국인대회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각 동맹국 지도자들에게 “한국 민족의 완전 독립을 요구하고 우선적으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할” 것을 촉구하는 전문을 발송하였다.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자 남편 엄항섭은 1945년 11월 23일 임시정부 요인 제1진으로 먼저 환국하였다. 아이들과 함께 이듬해 7월 광복군 제2지대와 미군 군함을 타고 귀국하였다. 광복 이후에는 주로 김구를 수행하며 한국독립당의 국내지부를 건설하는 일에 몰두하는 남편 내조와 가족을 돌보는 일에만 몰두하였다.광복 후 자리 잡은 ‘서울 중구 도동 1가 127의 29번지’를 원적지로 삼아 호적을 만들고, 1950년 5월 27일 서울 중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6·25전쟁으로 남편이 납북되자 남편의 본적지인 경기도 여주군(驪州郡) 금사면(金沙面) 주록리(走鹿里)에 자리 잡았다. 오랜기간 ‘월북가족’으로 낙인찍혀 역경의 세월을 보냈으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홀로 자녀들을 키웠다. 말년에 중풍을 맞아 어렵게 생활하다가 1981년 1월 1일 사망하였다.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